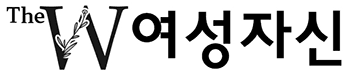식탁 앞에 앉으면 무엇인가 텅 빈 것 같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음을 느낀다. 아내가 만든 김치며 된장국 등에선 어머니의 음식 맛을 느낄 수 없다. 어머니가 담근 김치 하나만으로도 입맛이 당겨 단번에 밥그릇을 비워 내던 모습을 떠올린다. 멸치 젓갈을 넣은 김장김치, 손으로 양념을 버무려 낸 생김치 맛을 어디에서도 맛볼 수가 없다.
아내와 어머니의 김치 맛이 왜 다른 것일까. 어머니의 김치 맛은 어릴 적부터 길들여져 맛의 향수가 되어 녹아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내는 바쁜 생활 탓에 약식으로 김치를 담그기가 예사이며, 심지어는 시장에서 김치를 사 와서 식탁에 올려놓기도 한다. 김치 맛을 내는 여러 조건 중에서 젓갈 맛을 뺄 수 없다. 김치를 담그기 위해선 상품(上品)의 양념과 배추. 무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젓갈을 잘 담궈 두어야 한다.
나는 어머니의 마음과 삶이 젓갈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 멸치나 새우가 젓갈이 되기 위해선 뼈와 살이 푹 삭아서 흐물흐물해져야 한다. 자신의 육신과 마음을 온통 다 내어 주어야 입안에 가득 고이는 젓갈 맛이 될 수 있다. 소금에 저려서 뼈와 살이 녹고,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썩어 발효돼야 한다. 자신을 버려야 참 맛을 내는 것이다. 어머니의 일생이 그러하지 않은가. 가족들을 먹이고 입히며 위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버리는 것을 오히려 행복으로 알아오지 않았는가.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은 발효식품이다. 잘 삭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오랜 세월과 정성이 필요하고, 여기에다 알맞은 기후가 보태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정성과 사랑이 깃들어야 발효가 잘 될 수가 있다. 어머니가 담근 김장 김치엔 민족 고유의 맛이 흥건히 고여 있다. 한국의 흙과 기후와 채소들이 만들어 낸 맛과 어머니의 손맛이 보태어진 진미이다. 삼동(三冬)의 추위를 견디고, 새봄을 맞기까지 식욕을 돋워주는 김장김치 맛 속엔 한국 가을의 풍요와 맑음이 깃들어 있고, 겨울의 추위와 지혜가 담겨 있다.
김치를 먹을 때의 서걱서걱 내는 소리 속에 젓갈 맛이 우러나와 오묘한 맛을 낸다. 서양의 셀러드는 야채 위에 소스나 마요네즈를 뿌려 먹는 지극히 단순한 음식이지만, 우리 김장김치는 배추. 무를 오랫동안 소금에 절여 두었다가, 고추. 생강. 파. 깨 등을 섞은 양념에 청각, 굴 등과 젓갈을 넣어 맛을 낸 것이다. 채소의 절임과 발효로 빚어내는 맛의 오케스트라라고나 할까. 지휘자는 말할 것도 없이 손으로 양념을 슬슬 흩어가며 김장을 하는 어머니다. 김장김치는 맵싸하고 짭조름한 가운데, 화끈한 맛이 있다. 우리 김치 말고는 어느 음식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맛이다.
김치 맛은 팔도(八道) 팔색(八色)이다. 지방마다 다르고 집집마다 다르다. 김치 맛 속에는 기후와 지형과 사람들의 성격이 드러난다. 국에 넣으면 시원한 김칫국이 되고, 된장과 함께 넣어 끊이면 구수한 김치찌개가 된다. 한국의 어떤 음식과도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맛의 샘이라고나 할까.
우리 민족이 궁핍했던 시대에도 침치 맛으로 식사 시간이 즐겁기만 했다. 마음껏 자식들을 배불리 먹일 수도 없었고, 변변한 반찬을 해줄 수도 없었다. 남새를 양념과 젓갈을 넣어 손으로 버무려서 손맛을 내어놓았을 뿐이었다. 온 식구들이 식탁에 앉으면 웃음이 감돌고 먹음직스러웠다. 어느 음식이나 입에 맞지 않은 것이 없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고 금방 무치고 끓인 음식 들에선 어머니의 사랑이 배여 있었다. 어머니는 가족들의 식사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흐뭇한 미소를 띄시며 자신은 누룽지나 식은 밥도 마다하지 않으셨다.
어머니를 다시 뵐 수 없게 되자, 알싸하고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이는 김치 맛이 새삼 그리워진다. 자신을 소금에 절이고 뼈와 살을 녹여서 가족들을 위해 진국 맛, 젓갈 맛을 낸 분이 어머니이셨다. 자신을 소리 없이 발효시킨 삶으로 가정에 건강과 웃음을 피워 내셨다. 아, 어떤 업적이나 남에게 내세울 일이 없더라도, 어머니의 일생은 거룩하고 훌륭하셨다.
나는 가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뼈와 살을 녹여 발효시켜서 기막힌 묘미를 내는 사람이 될 수 없을까를 생각해 본다. 그것은 아름다운 헌신이고, 깨달음의 경지이며, 사랑의 실천이 아닐 수 없다. 사랑은 입안에 녹아 사라지는 사탕 맛이 아니고, 뼛속에 남아 있어서 입맛을 되살려 주는 젓갈 맛이 아닌가 한다.
나라를 잃고 말, 글, 이름조차 빼앗겼던 때가 있었지만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등 음식 문화만은 뼈 속에 녹아 있어서 어쩔 도리가 없었다. 우리 문화와 기질을 지켜 낸 게 음식 문화였다. 가족들의 식사시간이 즐거워야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한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식탁이 텅 빈 것처럼 맛의 공백과 허전함을 느낀다. 어머니의 김치 맛과 사랑의 손맛이 그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