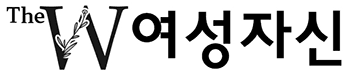우리가 ‘그냥 성격이 그렇다’고 넘기는 행동들 중에는, 사실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다. 끊임없는 자기비판, 완벽함에 대한 강박,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습관,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성향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을 수도 있다.
최근 프랑스 심리 칼럼니스트 에밀리 로랑(Émilie Laurent)은 The Body Optimist를 통해 “여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는 트라우마 기반 행동 8가지”를 소개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이다.
-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낀다
휴식이 두렵다. 누워 있으면 ‘시간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늘 무언가를 해야만 마음이 편하다면, 이는 “쉬는 것은 게으름”으로 배웠던 과거의 경험 때문일 수 있다. 어린 시절, 쉴 권리가 허락되지 않았던 기억이 몸에 새겨진 것이다.
- 모든 행동에 ‘이유’를 덧붙인다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 여기서 멈추지 못한다. “운동했으니까 괜찮아”, “피곤하니까 칼로리 보충이 필요해.” 자신의 선택을 늘 정당화해야만 안심이 되는 사람은, 한때 자신의 말이나 욕구가 ‘인정받기 어려웠던 환경’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있다.
- 도움을 거절한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누군가 손을 내밀면 자동으로 반사적으로 거절한다. 남에게 의지하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이는 ‘도움을 받는 법’을 배워본 적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방어기제다. 어릴 적 어른이 믿을 만하지 않았던 경험이 만든 결과다.
-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
피곤해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좋아요”라고 말한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것 같은 불안, 갈등을 피하려는 습관이 몸에 밴 것이다. 이 또한 “타인을 먼저 생각하라”는 오래된 생존 전략의 잔재다.
- 갈등이 생기면 침묵으로 사라진다
누군가 언성을 높이면, 싸우거나 설명하지 않고 그냥 ‘닫힌다’. 말을 삼키고 몸이 굳어버린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동결 반응(freeze response)’이다. 과거의 자신이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상황 즉 공포, 위협, 무력감 등의 기억이 현재의 반응을 지배하는 것이다.
- 자신의 성공을 축소한다
칭찬을 받아도 “별거 아니에요”라며 넘긴다. 작은 성취조차 스스로 기뻐하지 못한다면, 어릴 적 성취가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을 수 있다. “잘했어” 대신 “이번엔 운이 좋았네”를 들었던 기억은, 자기긍정의 뿌리를 약하게 만든다.
- 사소한 결정조차 어렵다
옷을 고르거나 메뉴를 정하는 일조차 지나치게 망설여진다면, 그건 단순한 우유부단함이 아니다. 과거에 자신의 선택이 늘 비판받았거나, “틀리면 안 된다”는 압박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 자신의 고통을 ‘별일 아니야’라며 축소한다
다쳐도, 아파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스스로를 달랜다.“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괜찮지 뭐.” 이 겸손한 문장은 사실 ‘부정의 언어’다. 고통을 비교하고 축소하는 습관은 치유를 지연시킨다. 당신의 아픔은 그 자체로 충분히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
“트라우마는 무의식 속에서 일상으로 스며든다”
로랑은 “이러한 습관들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과거의 생존 방식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트라우마는 단지 기억 속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말투와 태도, 관계 속에 여전히 살아 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한다. “자신의 행동을 비판하지 말고, ‘왜 이렇게 됐을까’를 부드럽게 바라보세요. 그게 바로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출처: Émilie Laurent, The Body Optimist (2025)